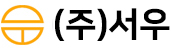삼성그룹이 28일 발표한 ‘경영 쇄신안’의 핵심은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의 해체와 계열사별 이사회 중심의 자율경영이다. 이를 통해 창립 이후 첫 총수 구속 사태를 불러온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는 구상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재벌들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큰 곤욕을 치른 만큼 경영 쇄신의 대열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람직한 일이다.그러나 고질적인 정경유착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개별 그룹 차원의 ‘경영 쇄신’보다 ‘상법 개정’이 더 시급하다. 경영 쇄신은 총수 맘대로 뒤집을 수 있다. 재벌에 대한 비판 여론이 식으면 없던 일이 되기 일쑤다. 삼성그룹이 2008년 4월 ‘삼성 특검’ 직후 내놓은 쇄신안이 2년여 만에 말짱 도루묵이 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사회 중심의 자율경영은 선언만 한다고 실현되지 않는다.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한다. 삼성전자·현대자동차·에스케이 등 53개 대기업이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냈는데, 이사회 의결을 거친 곳은 단 2곳뿐이고 그나마 형식에 그쳤다. 이사회가 총수의 거수기 노릇을 하고 총수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사들이 사외이사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이사회가 존재했다면, 사외이사들이 총수의 전횡을 감시·견제할 수 있었다면 제동이 걸렸을 것이다. 기업을 위기에 빠트리는 것은 외국 자본의 경영권 위협이 아니라 황제경영이라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상법 개정안의 핵심 조항인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 도입’은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을 가능하게 만드는 방안이다. 이런 점에서 경영 쇄신을 얘기하는 재벌들이 다른 한편에선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일단 소나기만 피하고 총수의 제왕적 권한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정경유착으로 온 나라를 뒤흔들어놓고 염치없는 태도다.상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첫 관문인 법사위의 법안심사소위조차 넘지 못했다. 처음부터 상법 개정에 반대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끝까지 몽니를 부렸고, 야당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결기를 보여주지 못한 탓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교훈을 벌써 잊었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 총수들이 지난해 12월6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앉아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